건축가와 정원사의 만남: 글쓰기 생산성 2배 만드는 비결
하향식 글쓰기(건축가)와 상향식 글쓰기(정원사)의 장단점을 하나로 묶어, 아이디어의 폭발적 확장과 논리적 구조를 동시에 잡아보세요. 두 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법부터,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 팁까지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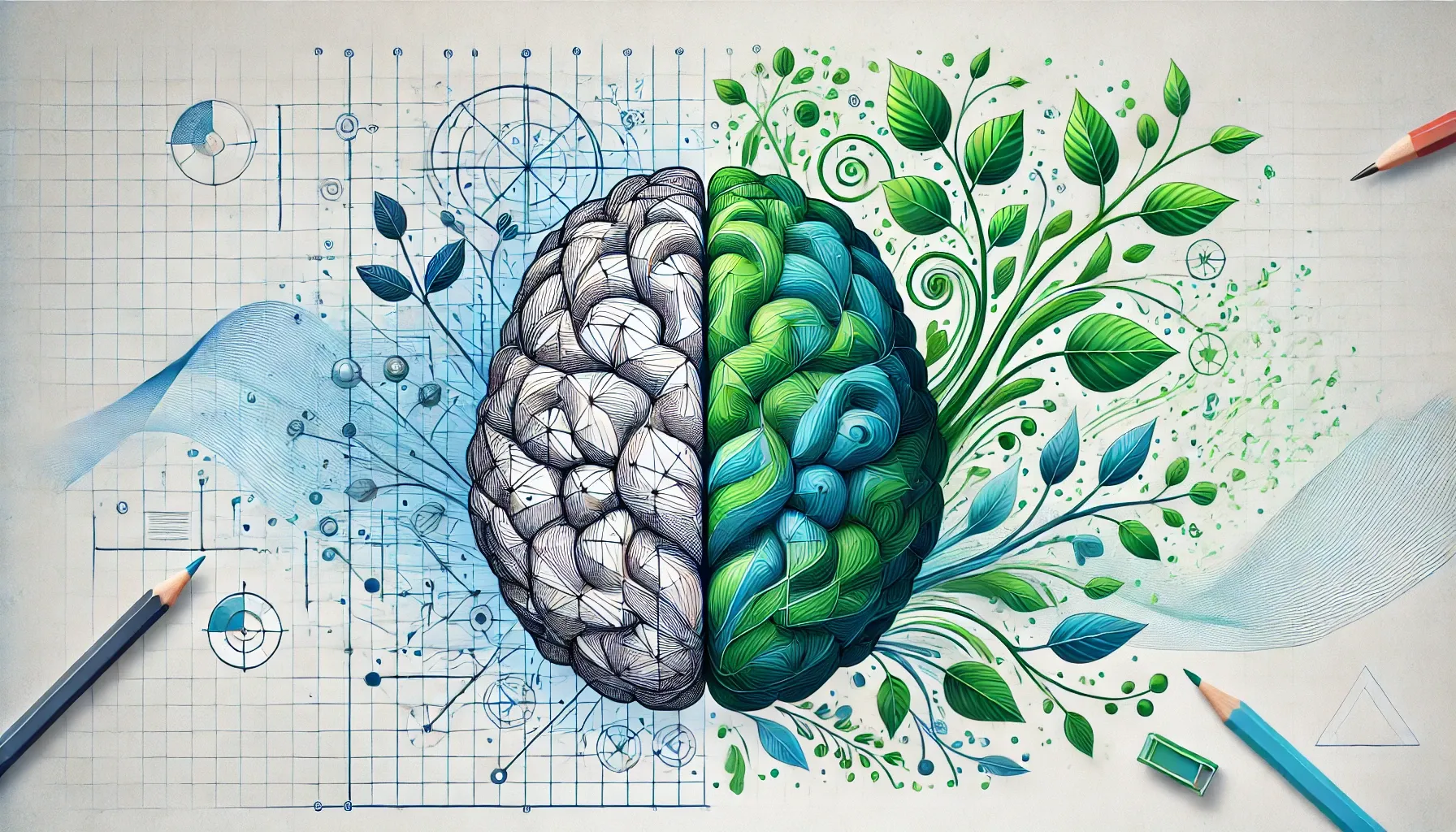
안녕하세요?
생산적생산자입니다.
지난 시간엔 하향식-상향식 글쓰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선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내용에 이어서 두 방식의 특징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 어떻게 두 방식을 적절히 조합해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향식 vs 상향식 글쓰기
하향식 글쓰기는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글쓰기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제, 개요, 들어갈 내용을 확정하고 구조가 모두 짜여진 청사진에 맞게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top-down이라는 의미에 충실하게 전체를 조망하고 결정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진행합니다.
상향식 글쓰기는 반대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문장을 적어 나갑니다. 적어나가는 방식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통찰을 구조에 녹여내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영어로 bottom-up이라는 표현답게 하나의 요소에서 시작해서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선호하는 글쓰기 스타일은 다릅니다. 모든 걸 정해놓고 적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문장을 시작하고 나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영감을 따라가면서 글을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글쓰기 스타일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적을 때 하향식과 상향식 모두 사용하는 편입니다. 현재 개인지식관리 뉴스레터를 만드는 건 적어야 할 목차의 로드맵을 짜놓은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주제가 주어진 상황이니 하향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의 개별 주제는 전체 목차를 채우는 요소가 정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글쓰기를 할 때도 하향식과 상향식을 섞어서 활용합니다. 개요를 작성하고 나서 글을 적는데, 개요를 채우는 과정은 기존 제텔카스텐과 세컨드 브레인에 쌓인 메모를 활용하면서 상향식으로 진행합니다. 개요를 적는 과정 자체는 하향식 흐름이지만, 개요를 채우는 과정은 상향식으로 작성된 메모들을 참고해서 진행합니다. 하향식과 상향식이 섞여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향식과 상향식은 함께 활용될 수 있는데, 이를 ‘건축가’와 ‘정원사’라는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닉 마일로(Nick Milo)입니다.
건축가 VS 정원사 작업 방식
Linking Your Thinking을 운영하는 옵시디언 전도사 닉 마일로는 하향식과 상향식 글쓰기 과정을 건축가와 정원사의 작업 방식에 비유합니다. 건축가는 건물을 짓는 도면을 완성하고 나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든 요소가 미리 확정되고 난 후에야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의 일은 하향식 글쓰기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만 모으고 사용합니다.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이외의 것들은 배제하고 진행합니다. 배제한다는 건 현재 목표 이외의 다른 가능성을 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글도 하나의 건축물 같이 잘 짜여져 있고 논리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원사는 건축가와 반대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씨앗과 묘목에서 시작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나 생각에서 시작해서 한 단계씩 키워나가면서 구조를 만들고 글 전체를 완성합니다. 사전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면서 식물을 키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정원사는 글의 방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미리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열린 결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어디에 도달할지 모르는 결론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제텔카스텐 메모법이 지향하는, 통찰이 모이는 방향대로 진행하는 글쓰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 모드의 전환 가능성
이렇게 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처럼 보이지만, 상향식과 하향식 방식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닉 마일로는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막히는 순간이 오면 모드를 바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나에게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는 연료를 바꿀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연료 방식이 되는 겁니다.
하향식으로 진행하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건축가 스타일의 하향식은 하나의 원리를 글 전체에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직된 사고에 갇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정원사의 상향식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품고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정원사의 상향식 스타일은 너무 다양한 정보가 모인 상태에서 무엇을 글쓰기에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이럴 땐 모아놓은 재료를 구조적으로 보는 하향식 조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를 한번에 보면서 부분과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지식의 단위에선 보이지 않던 통찰이 구조 파악을 통해서 가능한 경우가 많고, 다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두 글쓰기 모드를 유연하게 전환하다 보면, 글의 완성 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가치 더하기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가치 더하기 과정
결국 글쓰기는 재료를 갖고 가치를 더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치를 더하는 과정은 구조와 연결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구조,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와 연결은 성격이 반대로 보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치를 더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글쓰기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글쓰기 방식은 건축가와 정원사 방식을 오가면서 진행합니다. 하나의 큰 도면은 나와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방이 미리 만들어져 있다면(하향식) 그 안을 채우는 가구나 인테리어는 기존에 모여있는 생각의 흐름을 조합해보면서 (상향식) 결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의 혼합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글쓰기 스타일들도 충분히 공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하나의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키워가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전체의 그림과 들어갈 요소를 모두 정하고 나서 시작하는 스타일인가요? 주된 방식은 정해져 있더라도 막힐 땐 다른 모드로 전환해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쓰되, 필요할 땐 다른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개인지식관리의 방향성에 부합합니다. 제텔카스텐 메모법을 쓰면 상향식 글쓰기가 된다고 해서 모든 과정에서 상향식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의 가공과 출력 과정 모두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